예전에 낡은 것들의 힘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링크) 그 책이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나왔다.

책이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 다큐멘터리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거점들과의 연결을 보여준다. 예컨대 커뮤니티, 가족, 직장, 자신과 얽혀 있는 다른 사람들 등등이다. 옷에 대한 반감이 첫 에피소드의 첫번째 스토리였다는 점이 재미있었음.
이 다큐의 흥미로운 점은 주류 패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옷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다. 멋내기와 착장의 작동 방식이 무엇보다도 준거 집단에 기대고 있는 게 크다는 걸 보여준다. 물론 최근 들어 준거 집단이 SNS로 확장된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의미가 희석되고(대신 유니크함에서 수요가 생긴다), 트렌드의 힘이 더 강해진 모순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옷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한 다양성이 패션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이러이러하게 생겼으니 멋지다라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는 세상일까. 이런 말은 내가 사는 방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맞으니 멋지다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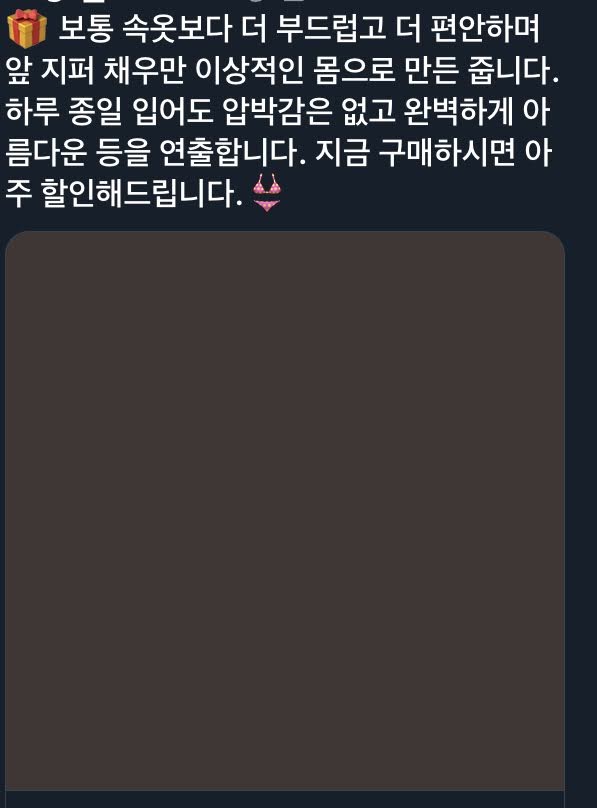
흔히 볼 수 있는 SNS 광고에서 과연 "이상적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위 글은 속옷 광고인데 예컨대 가슴이 다르게 생겼다면 그저 폼이 안나는 거고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 이런 건 많은 방면으로 뻗어갈 수 있다. 허리가 가는게 이상적이라면 선천적으로 허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폼이 날 수 없는 걸까. 키, 생긴 모습, 몸집, 자세, 얼굴의 크기는 어떤가. 이 모든 곳에서 "이상적인"이라는 말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걸 여전히 볼 수 있다. 타고난 신체가 극복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을까. 장애인은 어떨까. 애초에 다 틀린건가? 패션이 과연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방법일까.
이건 목표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그런 걸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 자체를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착장이 만들어 내는 멋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패션 세상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는 다양성이란 몸집 큰 모델의 비율, 논 화이트 인종의 비율 같은 걸 넘어서서 옷이 어떻게 사람 몸에 닿았을 때 효용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가로 나아가게 된다.
즉 시선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못생긴 옷은 없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옷이 있을 뿐이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멋지게 활용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간다. 이건 옷, 더 나아가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조금 더 진중하게 물어봐야 할 때다.
낡은 것들의 힘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옷에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고, 진지하고, 즐겁다. 패션 생활이란 그러면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연결이 된다. 사회가 개인의 옷 입기를 가감없이 바라보지 않는 한 또한 착장에 잉여의 의미를 부여하는 한 이 문제는 더 나은 답을 향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좋은 것 입기란 결국 사회 변화의 문제고 다양성 포섭의 문제다.




댓글